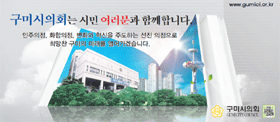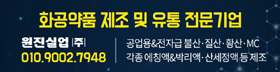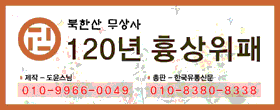신휘 시인 '꽃 이라는 말이 있다' 시집 출간, "시인은 꽃을 꽃이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땅의 숨결이 배어 있는 흙빛 시어들의 향연!"
"삶의 진심을 생활의 언어로 발효시킨 생명의 시편들!"
시는 삶의 경이로운 순간들을 포착하는 시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벚꽃이 만개한 4월에 신휘 시인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시집이 출간됐다.
생의 이면에 숨어 있는 생명력의 원천에 대해 천작해온 신휘 시인이 펴낸 '꽃이라는 말이 있다'는 분꽃, 열부꽃, 부꽃' 맨느라미, 가시연꽃 등이 자라는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에 수목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매미, 호랑거미, 자벌레, 삼자리를 낢은 론재들의 나면세계를 쓰다듬고 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작품 속에 투영해 왔다. 흙먼지 날리는 세상살이를 관동하는 삶0란, 가난과 슬픔이 맑게 우러나오는 우물처럼 날마다 깊어진다. 그 가깝고도 먼 땅 세기를 오라동안 지켜봐온 시인은, 삶이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해낸 웅숭깊은 시편들을 '꽃이라는 말이 있다'에 담아놓았다.
신휘·시인의 눈에 비친 일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순간 새롭거 창조된다. 시인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의 힘을 진심이라고 믿는다. 시인은 창조적 영감의 불꽃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시란, 저 물 위에, 괜시리 어룽대는 지 물빛"(사랑은 관시리 이룽대는 저 물빛 위에) 같다고 말한다. 시는 불꽃이 아니라 물꽃이 사그라진 자리에 스며드는 잔상이라고 표현한다. 신휘 시인에게 이러한 잔상은 시와 삶의 진심인 것이다.
시는' 아름다운 흉터로 남는 상처
희미한 것들이야말 유일하게 명징하다는 역설은 시의 본심 중 하나이다. 신희 시인의 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무꽃 자주 새를 이리저리 날고 있는 배추흰나비(무꽃 자주 새를 이리저리 날고 있는 배추흰 나비처럼 )의 날갯짓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리저리"라는 무방향성은 그 자처로 또렷한 지향성을 감추고 있다.
시인은 공중에 보이지 않는 배추흰나비의 자취를 "무꽃 자주 새"에서 발견 한다. 이 투명하게 어룽대는 공중의 존재가 시어의 의미와 기표 사이에서 이리저리, 유동하는 시적 파장이 된다. 이처럼 모든 흔적은 시적 파장으로 기억된다. 기억이 "긴 생각 거죽을 뚫고 나온 물의 멱. 그 끝에는 늘 후회와 탄식으로 얼룩진 꽃송이 한 점"(가시 연꽃1) 같은 것이라면, 애초에 우리의 삶이 기억하고 있는 잔상은 "얼룩진 꽃으로 피어날 운명이다. 그런 까닭어 신휘
시인에게 시쓰기란 희미하게 빛나는 '얼룩진 꽃'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뱃속까지 스민 상처만/아름다운 흉터로 남는 법"(옹이)을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때를 놓쳐버린 고깃배처럼 먼 생의 수평선만 하염없이 보고 서 있다가 더는 출항할 뭣도 없이 지는 해에만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하고 버려진 이곳이 바로 내 생의 뻘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뻘밭 전문-
위의 시에서 우리는 시인과 시의 '아름다운 흉터'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오도 가도 못하고" 살아자는 것처럼, 시의 운명은 "먼 생의 수평선만 하염없이 보고 서 있다가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시인은 삶과 시가 겹치는 순간의 진심을 받들 줄 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내 생의 뻘밭"이란 내 삶과 시의 진심'인 것이다.
시는, 몸의 기억으로 표현하는 삶의 윤리
진심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된 인간의 윤리 이다. 문학평론가 김종광은 이시집의 해서에서 "인간의 삶이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기에 결국 지나온 과거에 많이 기대고 있는 셈이다."라고 표현했다. '꽃이라는 말이 있다' 에는 기억의 한 불꽃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서사기 빈번하다. 이는 신휘시인에게 내면화되이 있는 시적 윤리가 발현된 까닭이다.
시민의 윤리는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이 시집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몸' 모티프를 통 시인은 시적 윤리의 울림을 이야기한다. 시적 윤리는, 우리의 기억이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고 몸에 주름의 파동으로 남을 때 마련 된다. 시인은 이렇게 마련된 몸의 기억을 통해 시와 삶의 윤리에 접근한다. 시인이 육친 이나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으 삶을 심층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주걱 하나 닳아 없애는 데 꼬박 사십 년이 걸렸다는 어머니는 부엌 한켠에 신주단지 모시듯 입히 몽툭한 밥주걱 하나 걸어놓고 사셨다.
-목숨이란 실로 이와 같다
모질고 찰지기가 흡사 발의 것과도 같거니와, 그곡기 끊는 일 또한 한 가계의 초왕을 내어다 버리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대지 쇠로 만든 주걱 하나를 다 잡아 먹고도 남는 구석이 밥에게는 있는 것이다.
-'주걱' 전문
이 시에서 주걱의 일생은 스스로의 목을 닳아내고 남은 "뭉둑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시인의 윤리는 주걱의 남은 부분이 아니라 닳아 없이진 깃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라는 존재와, 몸과 몸이 모여들어 내력과 역사를 형성하는 "가계'로까지 확장해 간다. 이렇게 몸의 닳음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닳아 없어진 "사십 넌"이라는 시간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없는 존재를 기억해내는 서사의 방식
신휘 시인은 희미한 잔상으로 남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몸'으로 육화해내는 뛰어난 시적 감각을 보여준다. "윽 윽, 몸 안에 나머지 설움이 쌓여 미침내 풍선처럼 그 등이 부풀어 오르다 산이 되고, 산맥이 되어 높이 다시 솟구쳐 오"('낙타, 하나')르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몸'안에서 닮아 없어진 "썰움이 쌓여(......) 산이 되고, 산맥이 되"는 것을 본다. 이때 '산'과 '산맥'의 형상은 시 '주걱'에서 닳아 없어진 부분과 다르지 않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집 꽃이라는 말이 있다 에서 “있다"는 존재방식이 사실은 없는 존재를 기억해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감각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서사와 윤리가 있다. 시인은 그러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기억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신휘 시인이 실천하고 있는“있다"라는 윤리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있는 것들은 기억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시집 꽃이라는 말이 있다가 우리 에게 건네고자 하는 시적 진심인 것이다.
추천의 말
신휘의 시에는 우리가 기억의 저수지에 담아놓은 농경문화의 일상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게으르게 한 줄씩 읽다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풍경들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온다. 천천히 오랫동안 발효되어 유기 질화 된 그의 시를 되새김질 하다보면 생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위대한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게 된다
-박기영(시인)
밤하늘엔 명명되지 못한 숱한 별들이 있고, 땅속엔 수천 년째 발아를 기다리고 있는 씨앗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분명히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못한 그늘속의 삶들이 있다. 또한 시인들이 있다. 이 무궁한 잠재 태로부터 시가 오고 있음을 신휘 시인은 들려주고 있다.
-손택수(시인)
신휘 시인에게 시란 짙은 슬픔과 화해하는 일이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존재들을 내 안의 마당으로 불러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 온 잊힐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나가는 일이며, 앙상한 탱자나무로 호기롭게 사랑하는 일이다.
-김 종광(문학평론가)
저자 소개
신휘 시인은 1971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 1995년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고향에서 포도농사를 하고 있다 '오늘의 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2014년 '운주사에 가고 싶다'를 펴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꽃이라는 말이 있다' 시집에서 영감을 얻은 "꽃개'
자유인 체게베라를 닮은 시인